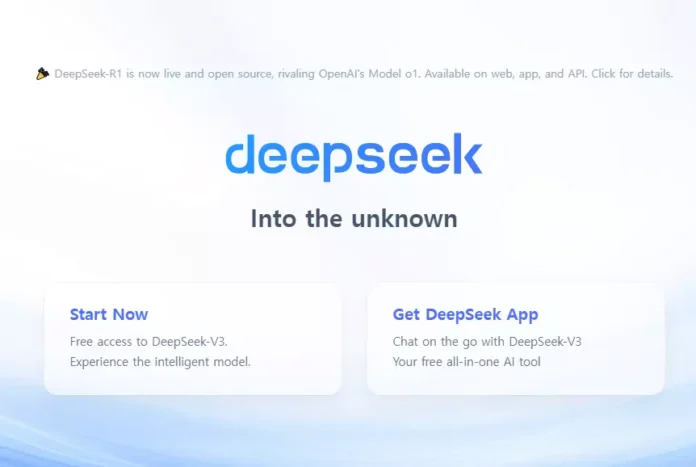국민·하나·우리은행, ‘딥시크’ 원천 차단…시중은행 AI 보안 강화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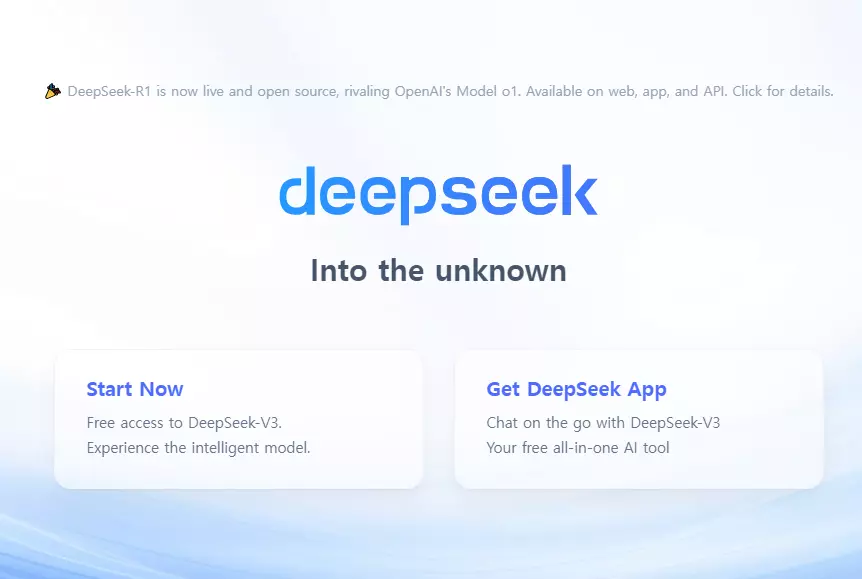
국내 금융권에서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보안이 최우선인 만큼,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주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과 국책은행까지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하면서 금융권의 AI 보안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원천 차단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4일부터, 우리은행은 6일 오전부터 딥시크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내부망과 외부망에서 모두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원래부터 내부망에서 생성형 AI 사용이 제한됐다. 은행 전산 시스템이 망 분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챗GPT 등 AI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외부망을 통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딥시크의 보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외부망에서도 해당 AI 서비스 접속이 차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도 지난달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막았으며,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역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권 내에서 AI 서비스에 대한 보안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딥시크는 최근 ‘개인정보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챗GPT 등 기존 AI 챗봇과 달리, 딥시크는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부터 세부적인 온라인 활동 데이터까지 저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권에서는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AI 보안 규제는 향후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생성형 AI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AI 서비스가 금융 데이터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AI 기반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보안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해외 AI 서비스 이용 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AI 사용 규제 강화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보다는 보안 강화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독자적인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국내 AI 서비스와 협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현재 AI 기술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권의 딥시크 차단 조치는 단순한 AI 사용 제한을 넘어, 국내외 AI 서비스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영화] 30일 기억을 잃은 부부의 유쾌한 로맨스](https://www.intramagazine.com/wp-content/uploads/2025/04/ChatGPT-Image-2025년-4월-18일-오전-09_44_33-300x200.webp)